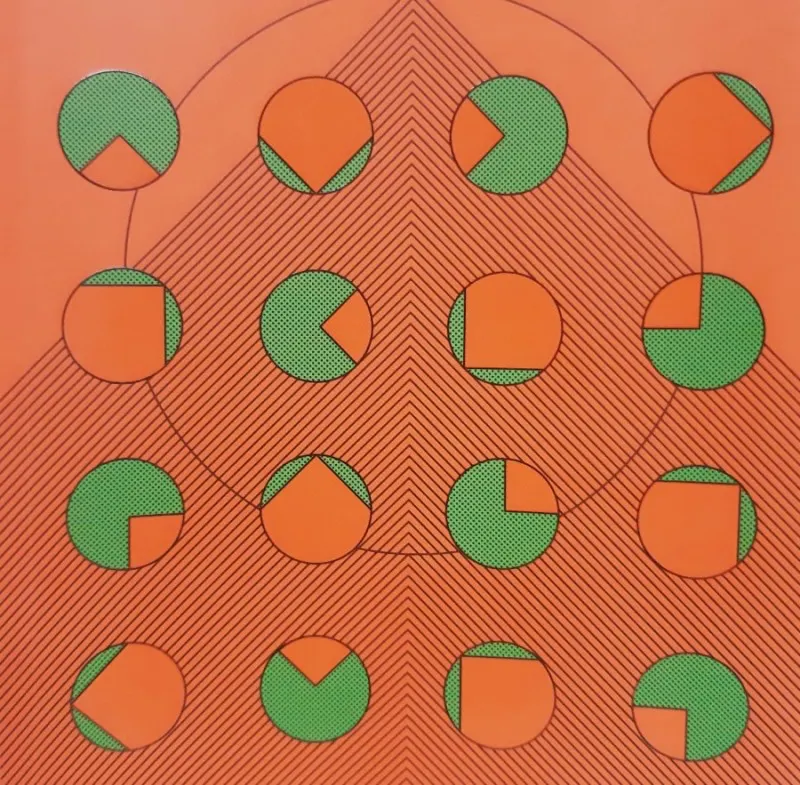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정신병자"가 욕설로 쓰일 때의 맥락에서 처럼, 정신병이란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나아가 구제불가능한 질병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를 편의상 "분리형 편견"이라 하자. 다른 하나는 "정신력"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맥락에서 처럼, 정신병은 육체의 병에 비해 그 심각도가 낮고,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사소한 질병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를 편의상 "극복형 편견"이라 하자.
정신질환자들은 두 편견 모두를 극복해야한다. 그런데 두 편견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극복형 편견”에 대항하다보면,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얘기하게 되고, 이는 분리형 편견을 강화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거꾸로 “분리형 편견”에 대항하다보면, 정신질환의 평범함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극복형 편견"을 강화시키기 십상이다.
사실 이미 정신질환자들에게는 낙인같은 편견이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각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마치 N극에 붙어있던 철가루를 힘껏 떼어놨더니 S극으로 달라붙어버리는 형상처럼, 하나의 편견이 다른 편견으로 바뀌기만 할 뿐, 편견 자체가 극복되기는 아주 힘들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이러한 두 편견을 뛰어난 스토리와 영상미라는 무기로 가차없이 부수어버린다.
생각보다 평범함을
많은 의학드라마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명확하다.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의사가 질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진단하는 에피소드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거나 흐릿하게 만들거나 극의 핵심이 되는 갈등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극의 핵심 줄기를 이끌고 가는 환자들은, 의사, 간호사, 또는 그들의 동료나 지인, 가족들이다.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나를 진료해주는 선생님, 나의 직장 상사, 내가 신뢰하는 동료등과 같은, 내 주변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평범해보이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싸우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따라가다보면, 그러한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나에게도, 또는 내 주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그렇게 정신질환에 걸리는 일이 다른 어떤 질환에 걸리는 일 만큼이나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일임을 관객은 탁월한 스토리라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이입하는 이들이 정신질환을 얻게되는 과정을, 그 과정의 평범함을 드라마는 보여준다.
생각보다 심각함을
그러는 한 편, 드라마는 영상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탁월하게 살려, 각 인물들이 겪는 정신질환이 어떤 느낌일지를 선명하게 전달한다. 발가벗고 춤을추며 나를 드러내고픈 욕망, 숨이 막혀 당장 10초 뒤에 죽을 것 같은 공포, 숟가락조차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기력감, 그로 인해 생을 마친 아내를 둔 자살 생존자의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텍스트만으로는 절대 전달할 수 없는 그 감정과 공포들을 드라마는 치밀한 비유와 섬세한 특수효과로 기어코 관객의 것으로 만들어낸다. 한 번 그 공포, 무기력감을 엿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텍스트를 통해 자극되는 상상만으로는 공감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다. 상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숨 막힐 것 같은 공포”가 그런 감정이다. 이런 감정에 공감하거나, 또는 공감할 계기를 얻기 위해서, 드라마는 역설적으로 기존과 완전히 다른 관점과 수단으로 이 감정을 전달해낸다.
우리 모두, 경계에 있음을
우리는 흔히 내 주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제나 나름의 기준으로 그 평범의 경계를 긋고, 그 바깥의 사람들을 주변인, 또는 외부인으로 타자화한다. 정신병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타자화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명해보이는 경계가 환상임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것 뿐이다. 중심에서 경계를 보고 있었다면, 그 경계로 걸어가 그곳에서 다시 중앙을 바라보는 것. 그 과정에서 내가 경계라고 생각했던 곳이 또 다른 중심이었고,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또 다른 경계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렇게 세상에는 수 많은 경계가 있고 또 진정한 경계는 없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
『장애학의 도전』의 표지. 각 점의 위치에 따라 볼 수 있는 관점들이 달라짐을 표현했다. 역설적으로, 가장 경계에서의 관점이 가장 넓은 시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심에서 경계로 걸어가는 일은 엄청난 용기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이러한 용기와 비용을 관객 대신 내주며, 관객에게 그러한 관점을 전달하는 드라마다. 우리는 가장 사랑스러운 대학병원 간호사 정다은의 시선으로, 누구보다 단단한 중앙에서부터 시작해 가장 타자화되는 경계의 끝인 보호병동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다시 병자의 시선으로 간호사를 보게된다. 손가락을 꺾는 강박을 지닌 환자를 내심 한심하게 보던 의사는, 다음 순간 항문외과에서 자신의 환자였던 항문외과 의사에게 자신의 항문을 내어주게 된다. 이렇게 드라마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거나 존경해 이입을 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관점을 이동시키는 롤러코스터처럼 작동한다.
드라마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가질 수 없었던 관점을 가지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가장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가장 조명받지 못하는 정신병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객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게 해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2023년에 보내는 울림은 크다.
사족: 전체적으로 뛰어난 완성도에 비해, 러브라인, 특히 서브 러브라인이 뜨악할 만큼 촌스럽고 재미없다. 여주들에 비해 남주들의 매력이 너무나 부족해 시종일관 “여자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러브라인은 초반의 리텐션을 위한 장치로 주로 동작하기에, 이 부분이 큰 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쪼끔 더 남주들의 매력을 보여주는 포인트를 한 두개라도 더 넣어주었더라면 어떨까, 또는 아예 러브라인 한 두개를 생략하거나 축소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